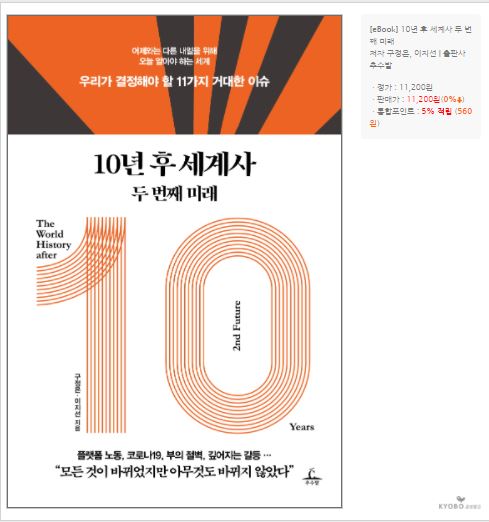
기상이변이 평범해진 세상
여름이 너무 덥거나, 겨울이 너무 춥거나, 혹은 여름이 너무 서늘하거나, 겨룽이 너무 따뜻하거나
기후변화시대의 지구에서 기장이변은 이제 더 이상 '이변'이 아니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호주 동부 뉴사우스웨일스는 곳곳이 불길에 흽싸였다. 시드니 광역도시권에
화재경보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6단계 '대재앙' 경보가 발령됐다. 남만구의 호주는 봄철인 이 시기에 산불이 자주 일어나지만, 그해에는 규모가 유난히 컷다. 남극의 기온이 이레적으로 올라가면서 호주에 극단적으로 고온건조한 날씨를 부를 것이라고 이미 과학자들은 경고한 바 있다.
북극 주변을 에워싼 대기의 장벽이 깨지면서 한기가 밑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북극진도동Arctic osdillation, Polar Vortex'은 최근 몇 년 새 과학자들이 주시해온 현상이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찬 기류가 밑으로 흘러내려와 겨울철 북반구으 중위도 지역을 오히려 더 춥게 만드는 것이다. 남극에도 이와 비슷한 '남극진동'아이 있다. 멜버픈 모나시 대학교 ARC기후변화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남극진동이 약해질 때 호주의 기온이 올라가고 강우량이 줄어든다. 연구팀이 1979년~2016년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남극 상공의 기류가 약해지면 호주는 고온건조한 정도가 4~8배 심해졌다.
그해 여름 러시아 내륙사하자치공화국에 있는 야쿠츠크 일대도 대형 산불에 흽싸였다. 북극권에서 45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야쿠츠크는 연평균 기온이 영하 8.8도로,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 중 가장 추운 곳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 도시를 비롯해 시베리아의 여러지역이 산불에 시달렸다. 야쿠츠크 주민들은 도시를 매운 연기에 '숨 쉬기도 힘든' 상황이 되자 집 밖에도 못나가고 며칠씩 버텼다. 오랫동안 안정돼왔던 생태계가 산불로 무너지자 숲속의 곤충들이 도시로 날아와,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었다.
러시아 북부 내륙지방에서는 그 몇 년 전부터 대형산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시베리안타임스》에 따르면 2018년 7월 일어난 산불의 연기는 캐나다 북부까지 이동했다. 2019년 산불은 더 컸다. 러시아 소방당국에 따르면 3만제곱킬로미터 벨기에만 한 땅이 불탔다. 하지만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불에 탄 면적이 12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 여름 시베리아 곳곳에서 기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북반구 내륙의 건조한 날씨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타이가'라 불리는 냉대림이 타들어갔다. 숲의 밀도는 아마존이나 보르네오가 높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러시아 북부의 아한대 타이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숲이다. 타이가가 불에 타면 땅 속의 온실가스가 대거 불려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다시 영향을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중국의 목재 수요에 맞추느라 타이가가 잘려나가는 것도 문제다 토양이 대기에 노출 되면 기후가 건조해지고 홍수와 산불이 늘어난다.
탄소중립을 이루는 속도가 닥쳐올 위기보다 빠를 수 있을까?
지구 전체의 온도가 2100년까지 1.5도 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묶어든다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미국과 함께 양강으로 꼽히는 중국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도 많이 쓰지만 석탄 역시 많이 태운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탁의 절반이 중국에서 소비된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2021년~2025년의 제1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는 전국 단위의 탄소 배출구넌 시장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 2010년~2012년의 금융위기에서 회복되지 못해 경제가 침체되고 청정에너지 쪽으로 이동해가면서 탄소 배출권 시장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2030년쯤 최대치에 이른 뒤 그 후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 탄소중립을 실현한다고 했으니 아직 40년이나 남았지만 중국 경제규모와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 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그린딜, 한국의 그린뉴딜
그린딜의 핵심은 순환형 경제를 통해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30 생물다양성 전략', 순환경제 행동계획과 그에 따른 산업전략, 녹색금융계획,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 제로 계획, 유해성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는 화학 혁신전략, 농업부문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농장에서 고기까지 Farm to Fork' 전략 등을 시작했거나 실행할 계획이다.
그린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통수단 개선이다.
2020년 7월 한국 정부도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탄소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환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그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산업 분야와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에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었다. 2025년까지 예산 73조 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 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온실가스 감축을 언제까지, 얼마나 하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2050년 탄소중립'을 반드시 그린뉴딜 목표에 포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탄소중립을 지향한다"고만 발표했다.
예산에서 가장 큰 몫인 20조 3000억원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 할당됐다.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 생산 되는 내역기관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비판이 쏟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몇 달 뒤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라고 밝혔다.
'책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네 단어, 나는 해 낼수 있다. (0) | 2023.01.26 |
|---|---|
| 10년 후 세계사 두 번째 미래-7 (0) | 2022.02.22 |
| 10년 후 세계사 두 번째 미래-5 (0) | 2022.02.18 |
| 10년 후 세계사 두 번째 미래-4 (0) | 2022.02.14 |
| 10년 후 세계사 두 번째 미래-3 (0) | 2022.01.09 |
